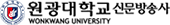원대신문방송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3박 5일간 라오스 비엔티안 그리고 방비엥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2022 신문방송사 해외연수기는 총 2회에 걸쳐 게재된다. /편집자

우리대학 신문방송사 연수단은 지난 동계 방학기간 (12월 19-23일) 중에 라오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의 주요 방문지는 왓시므앙 사원과 탐남 동굴, 블루라군 등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첫째 날 여행지인 라오스 국립대학, '라오스타 Lao sat' 방송국 방문과 둘째 날 여행지인 블루라군을 중심으로 라오스의 역사, 대학과 사회에 대한 연수기를 게재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이후 첫 연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침체됐던 학생 기자들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밝힌다.
라오스는 지난 2014년 방영된 예능 〈꽃보다 청춘〉을 통해 화제가 된 나라다. 특히 우리나라의 1970년대의 감성을 가진 풍경들이 이목을 끌었다. 현지인들의 순수한 모습과 친절함 또한 우리 연수단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신문방송사 연수단 19명은 지난해 12월 19일 한겨울 오후 익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저녁 8시였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그 후 탑승수속을 마치고 우리 연수단은 라오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야경이 기억에 남는다. 카메라에 그 모습을 온전히 담을 수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었다.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학생들도 있었기에 설렘이 더 배가 됐던 것 같다.
대여섯 시간의 비행 끝에 라오스에 도착했다. 처음 마주한 라오스는 생각보다 추웠다. 라오스의 12월은 우리나라의 늦여름에서 초가을의 날씨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연수단 일행은 얇은 옷가지를 챙겼으나 체감온도가 생각보다 낮았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늦은 밤이어서인지, 조명이 없어서인지 유난히 깜깜한 거리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람보다 개를 조심하라"고 했던 가이드의 설명에 텅 빈 거리의 풍경이 납득됐다. 이후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는 숙소에 도착했고,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연수 첫날밤을 보냈다.
아침이 밝아왔다. 라오스에서의 두 번째 날은 소의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이른 시간부터 소가 우는 소리에 자연스레 눈을 떴다. 창문 밖에선 누런 들판 위로 소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호텔에서 바라보는 다듬어져 있지 않은 자연의 모습은 분명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신선했다.
조식을 간단히 먹고, 버스에 오른 우리 연수단은 라오스 국립대학으로 향했다. 그곳은 라오스의 유일한 종합 국립대학 중 하나로, 반(Van-동내)동독 지역에 위치해 현지 사람들은 동독 대학교라 부른다고 한다. 동독대학의 첫 번째 풍경은 형형색색의 깃발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건물들이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눈에 담던 중 익숙한 글자가 들어왔다. '비엔티안 세종학당', 라오스에서 한국어를 보니 정말 반가웠다. 한국어학과가 있다고 듣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그 사실이 더 와 닿았다. 반가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흰 남방에 남색 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보였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낯선 이들의 친근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동독대학 견학을 마친 우리 연수단은 다시 버스에 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오스의 방송국인 '라오스타'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방송국의 규모는 작았지만, 에펠탑을 연상시키는 송전탑의 크기 하나만큼은 웅장(?)해보였다. 사회주의 방송국답게 뉴스제작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오락적, 정보적 성격의 컨텐츠는 거의 제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시 버스에 오른 우리 연수단은 왓시므앙 사원에 도착했다. 왓시므앙은 1563년에 라오스의 셋타티랏왕이 수도를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안으로 옮겼을 때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한다. 화려한 장식으로 둘러싼 사원 안은 온통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수수한 우리나라 사원과 달리, 화려한 태국 사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영어로 된 표지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많이 찾는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가이드가 전했다. 한 쪽에서는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쪽 건물안에서는 산자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원 방문을 끝으로 우리는 라오스 연수의 다음 여행지인 방비엔으로 향했다.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버스로 이동해 도착한 방비엔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높다란 카스트르 지형을 뛴 완만하고 둥근 산들은 이국적 정서를 자아내며 아름다움을 뽐냈고, 이곳을 '작은 계림'으로 부르는 이유를 알게 해줬다. 그 위로 떠오르는 열기구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연수 셋째 날 아침, 북쪽으로 창이 난 숙소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가 머문 도시인 방비엥은 원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으나,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밤이면 시내에서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술 파티를 벌여 점점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뉴욕 타임즈나 론리 플래닛 등에서 방비엥을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로 소개하면서 수많은 서양 배낭여행자가 방비엥 거리를 점령했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는 방비엥 곳곳의 식당이나 바에 누워서 술에 취한 채 늘어진 히피 스타일의 여행자들을 손쉽게 볼 수 있었던 곳이다.
다만,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제 방비엥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주도하는 곳으로 바뀐 상태라고 한다.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블루라군' 같은 곳에서는 사방에서 한국어를 볼 수 있다. 방비엥 자체도 이미 대성리나 강촌 같은 풍경이 됐다고 할 정도로 방비엥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많다.
그리고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왓 씨엥쾅(다른 말로 부다파크(Buddha Park)라고도 한다)'도 볼만한 곳이다. 메콩 강을 따라 펼쳐지는 야시장을 연수 마지막 날에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아직까지 새록새록하다.
액티비티 일정으로 가득 찬 블루라군. 블루라군은 카르스트지형의 석회암 바위들 속에 있는 에메랄드빛 호수이다. 이곳은 방비엥에선 약 6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다. 트럭 뒷좌석에 의자와 천장을 만들어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설계된 트럭이었고, 20여 분 정도 타고 가니 블루라군에 도착했다. 도착한 블루라군은 생각보다 작았고, 생각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에메랄드빛의 맑은 물웅덩이 위로 나무가 드리워져 있었고 깊이도 충분해서 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옆에는 작은 간이음식점도 있었고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공터도 있었다. 블루라군 옆에는 블루라군을 횡단하는 집라인이 있었다. 푸른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고, 에메랄드빛 물이 반짝이는 블루라군의 위를 줄을 타고 지나가는 코스였다. 빌딩 숲이 빽빽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라오스만의 풍경이었다.
그 이후 '탐 남' 동굴로 향했다. 방비엥 인근에 있는 수많은 동굴 중에서도 '물 동굴(Water Cave)'로 유명한 탐 남 동굴은 동굴 내부를 흐르는 물을 이용해 튜빙하면서 탐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수중동굴을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탐험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지만, 몇 번이고 줄을 놓칠 뻔한 필자에게는 아찔한 기억이었다. 입구는 서서 들어갈 수 있는 높이였지만, 몸을 숙여야 지나갈 수 있는 곳도 있었다.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그만큼 체력 소모가 심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집라인에서는 고향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을 봤다. 반면 흔히 볼 수 없는 수중동굴에서는 튜빙이라는 진귀한 경험이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하다. 방비엔의 자연 모습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놀라운 점은 관광지임에도 길이나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그곳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조혜연 기자 [email protected]
배성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