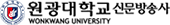세월의 체감속도는 자신의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기자의 나이가 21살이니까 기자가 느끼는 체감속도는 21km가 되는 식이다. 그렇게 21km를 달려 기자가 신문사에서 벌써 2번째 가을을 맞이했다. 작년에 본 붉게 물든 캠퍼스가 기억 속에 생생한데 다시 단풍의 계절이 왔다.
물들고 있는 것은 캠퍼스뿐만이 아니다. 기자의 교정지도 같이 물들고 있다. 물든 캠퍼스는 빨강, 주황, 초록으로 알록달록하기라도 한데 기자의 교정지는 그냥 빨갛다. 마치 동방신기의 팬으로 가득 찼던 2006년의 잠실주경기장을 보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동방신기 팬들의 빨간색 풍선이 노래에 맞춰 이리저리 흔들리듯 기자의 기사에도 빨간 교정표시가 글자에 맞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비유하면 될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정지의 단풍은 작년 가을에도 본 풍경이라는 점이다. 많은 것이 변한 1년의 시간 동안 기자만 제자리걸음을 하는 기분이다. 요즘에는 교정을 받는 꿈도 꾼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기에 놀라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나아진 점이 있다면 요즘들어 글에 대해 고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글에 정답이란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이 꼬리를 문다.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말이 되는 문장만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자가 쓴 글에 영혼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글을 볼때마다 글쓰기에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기자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생각하며 오늘도 기사를 쓴다.
<기자 수첩> 단풍 든 기사
- 기자명 신수연 기자
- 입력 2014.10.05 03:52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