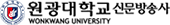모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머리에 쓰는 물건의 하나. 예의를 차리거나 추위, 더위,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한 것.' 하지만 요즘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내기 위한 패션의 아이템으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자는 트레이닝복을 비롯해 롱 드레스와 교복까지 다양한 옷차림에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모자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플로피햇(창이 둥글고 긴 모자)'부터 우리나라 대표적 모자인 '갓'까지 모자는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기자는 지난 9일 전주에 위치한 luielle 모자박물관에 다녀왔다. 전주에 위치한 luielle 모자박물관은 모자의 다양한 종류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자 박물관이다. 또한 모자박물관 중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는 5번째로 설립됐다. luielle 모자박물관은 세계적 모자 디자이너 셜리 천이 건립했는데 luielle 모자박물관의 luielle은 불어로 '그와 그녀'를 뜻한다.
luielle 모자박물관은 객사와 한옥마을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입장료는 딱 1천원이었는데 특이하게 입장권으로 뱃지를 줬다. 나무로 만들어진 뱃지에는 모자가 그려져 있고 '루이엘 모자박물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쉽게 구겨지고 찢어지는 종이 대신 나무로 만든 입장권이 더 기억에 남고 오래 보관할 수 있기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물관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1층에는 카페와 루이엘 모자매장이 들어와 있었고 2층에는 박물관이, 3층에는 체험관이 있었다. 4층과 5층은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3층 체험관에서는 모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평일에만 체험이 가능했다. 주말에 방문한 기자는 아쉽게도 체험은 하지 못했다.
기자는 2층으로 가기 위해 계단에 올랐다. 계단 하나마다 글귀가 붙어 있었다. 그 글은 샤를르 바라가 조선 모자에 대해 이야기 한 내용이었다. 그는 '조선은 모자의 왕국이다. 공기와 빛이 적당히 통하고 기능성에 따라 제작된 조선의 모자 패션은 파리인들이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고 조선의 모자 문화에 대해 칭찬하고 있었다.
글을 써놓은 계단뿐만 아니라 벽과 천장에서도 섬세함이 느껴졌다. 특히 천장에는 갓 여러 개를 붙여놓은 장식이 달려 있었다. 모자박물관답게 갓의 멋스러움을 이용해 박물관의 특색을 잘 살린 것 같았다.
박물관은 기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다. 사실 모자 박물관이라고 해서 '볼 게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그 걱정은 다 기우였다. 기자가 박물관에 들어서마자 볼 수 있었던 것은 모자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모니터에서 모자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기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모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정 중에는 12시간 이상의 기다림도 필요했는데 모자가 한번 만들어지기까지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모자들과 세계의 모자들을 분리해 전시해 놓고 있었다. 우리나라 모자들은 역사 순으로 모자를 배치시켜 놨다. 그래서 제일 처음 볼 수 있었던 것은 신라시대와 백제시대, 금관가야 시대의 왕관이었다. 같은 왕관이었지만 왕관마다 각 나라의 미술적 특징들이 잘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모자인 갓도 볼 수 있었다. 놀랐던 것은 갓의 모양이 변화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갓을 소중히 다루어서 평소 갓을 쓰지 않을 때 갓 통에 보관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 모자를 다 관람하고 세계의 모자들을 관람했다. 멕시코, 베트남, 몽골, 중국, 일본, 영국, 케냐 등 한 공간에 다양한 나라의 모자들을 전시해 놨는데 기자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베트남 모자 딱 하나였다. 아쉬운 것은 모자만 전시돼 있어 정확히 어떤 나라의 모자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나라의 모자들인 만큼 모자의 모양 또한 다양했다. 밀짚으로 만든 모자부터 털로 만든 모자까지 개성 넘치는 모습이었다.
전시 중간에는 우리나라 옛 고등학교 모자들을 전시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었다. 여러 고등학교의 모자들을 전시해놨는데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았다. 특히 전시된 모자들의 고등학교를 알면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는데 만약 그 중 자신의 아버지가 다닌 학교를 발견한다면 그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았다.
또한 피부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모자도 있었다. 일본의 방공두건이 그 예였다. 방공두건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쓰였던 것이었다. 방공두건은 일본 시민들이 공습을 당할 때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방공두건 뿐만 아니라 만주국의 모자도 볼 수 있었다. 기자가 고등학생 때 감명 깊게 봤던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봤던 모자였다.
각 나라의 모자뿐만 아니라 모자의 다양한 종류도 전시해 놨는데 낚싯줄에 실제 모자를 걸어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보토부터 시작해 페도라, 헌팅캡, 카플린등 다양한 종류의 모자가 있었다. 처음 들어본 모자의 종류들도 많았다. 또한 모자의 설명을 보며 세계적인 인식의 변화도 알 수 있었다. 설명에서는 페도라를 영원한 남성의 상징이라고 써놨지만 현재는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는 유니섹스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박물관에는 수백 개의 모자가 전시돼 있었다. 하지만 기자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던 것은 영친왕의 모자였다. 영친왕은 이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다. 일본으로 끌려간 지 56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은 비운의 황태자이기도 하다. 전시돼 있던 모자는 영친왕이 실제로 썼던 모자라고 한다. 영친왕이 전시돼 있던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들도 볼 수 있었다.
박물관 마지막에는 체험관이 있었다. 직접 루이엘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루이엘 모자 박물관을 다 보면 풀 수 있는 퀴즈가 마련돼 있었다. 기자 또한 체험관에서 사진도 찍고 퀴즈도 풀었는데 퀴즈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았다. 하지만 잘 관람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퀴즈를 풀면서 박물관에서 봤던 정보들을 복습할 수 있었다.
기자는 왕관과 갓을 모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기자가 생각했던 모자의 개념은 서양 중심적이었던 것 같다. 이번 관람을 통해 모자에 대해 갖고 있던 개념과 범주가 더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또한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겨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옥마을로 놀러 가는 길에 루이엘문화컬처센터를 들려 모자를 구경하는 것은 어떨까? 아는 만큼 보이듯 모자도 아는 만큼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신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