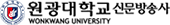쓰윽쓰윽, 계속해서 그어지는 빨간 줄. 후배의 기사를 교정해주고 있다. 이곳저곳 고치다보니 원고는 피바다를 이뤘다. 후배 녀석, 이걸 고치려면 고생 좀 할 것 같다.
후배들의 기사를 교정하다보면 가끔 수습기자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1년 하고도 반년 정도이니 그렇게 오래 전 일은 아니다. 그때는 교정을 받는 입장이었다. 작년 3월 <기자수첩> '나에게 기사란'에서 밝혔듯이, 내 글이 제3자에 의해 빨갛게 난도질 되면 생각 이상으로 마음이 아프다. 수습기자 시절의 나는 그 빨간 줄이 싫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선배들이 고치지 못할 기사를 쓰고 말겠어'라는 당찬(?) 포부를 안고서.
선배 책상 앞에 우두커니 서서 빨갛게 변해가는 교정지를 보며 절망하던 내 모습, 그후로 벌써 2년이 지났다. 지금은 내가 서있던 자리에 후배들이 서있고 그 앞에 내가 앉아 후배들의 기사를 교정하고 있다. 내게서 교정지를 받아가는 후배들의 마음은 어떨까? 추측해 봐도 모를 일이다. 다만, 그 마음이 욕심으로 차있으면 좋겠다. '감히 내 기사를 건드려?' 같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자기 성장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신문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후배들은 그들이 발행할 2015학년도 <원대신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들은 다가오는 내년이 막막하고 '잘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부터 앞서겠지만, 내가 지켜봐왔던 후배들은 분명 더 나은 <원대신문>을 만들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자수첩> 나에게 기사란 Ⅱ
- 기자명 김정철 기자
- 입력 2014.12.07 23:38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