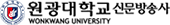김구와 김규식의 방북 이후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개성공단의 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해 개성공단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
서해북방한계선(이하 ‘NLL’)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있어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NLL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해ㆍ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설정했다.
NLL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초 북한측으로부터 제기돼 온 문제로써 이에 대해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정권은 북한측에 "평화수역이므로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우익단체는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얘기밖에 안된다", "노대통령의 NLL에 대한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을 보였다.
그러나 먼저 NLL이 어떤 선인지, 이를 두고 ‘영토선’이나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NLL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주장들이 NLL의 탄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과정 전체에 대해 철저히 일방적인 내용들로 점철돼 있고, 극심한 사실왜곡까지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군관계자나 이른바 ‘전문가’를 동원해 쏟아내는 주장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NLL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아쉬운 점은 핵무기는 6자회담에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부디 이번 방북합의 이행 시 정치적 목적이나 퍼주기식 평화구걸이 돼서는 안된다. 현재의 남북정상회담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신호탄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냉전세력도 그렇고, 외부적인 걸림돌도 없지는 않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