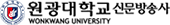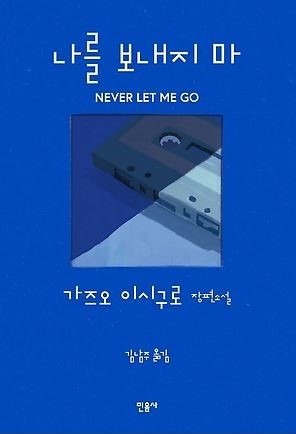
명작'을 권해달라니. 지극히 어려운 청탁이었다. 명작을 보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 나의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속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얼른 대답하기가 힘들다. 아마 평생 명확히 대답할 수 없을 것이며, 바로 그렇기에 명작이란 좋은 것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고민을 하게 만들 수 있으니.
그래서 결국 명작이란 뭘까? 형태론적으로 접근하여 한자를 풀어보면 이름난(名) 작품(作)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이름이 났다는 것은 단순히 유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만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라 '이름난'의 정도 역시 작품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명작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두 가지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원초적인 재미이다. 취향에 따라 재미가 갈리는 작품이라면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명작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고민거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수록 작품은 사람들의 기억 속을 더욱 오래 맴돌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빡빡한 조건임에도 이에 해당하는 명작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이나 최인훈의 『광장』과 같이 이미 '역사의 인증'을 받은 작품을 거론한다면, 굳이 나에게 귀한 지면을 내어 준 원대신문에 대단히 송구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작품 중 머지않아 명작의 반열에 들 작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제는 노벨문학상 작가로 유명해진 가즈오 이시구로가 2005년에 발표한 소설,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이다.
우선 『나를 보내지 마』는 명작의 첫 번째 조건, 즉 원초적 재미를 충실하게 만족한다. 이야기는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캐시'가 전에 다녔던 '헤일셤' 기숙 학교에 대해 회상하며 시작된다. 담담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캐시는 지극히 평범한 간병사처럼 보이며, 그가 추억하는 헤일셤 역시 특별할 것 없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모인 학교처럼 비추어진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캐시의 차분한 어조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점차 감지하게 된다. 헤일셤의 아이들은 어렸을 적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어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사춘기를 겪고 첫사랑의 열병을 앓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아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미래가 허락되어있지 않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거나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이들에게는 금기시된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직 성년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연애와 섹스가 허용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권장된다.
누구도 비밀이 유발하는 호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비밀의 힘은 원초적이다. 작품 전반에 깔려 있는 비밀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들은 취향에 구애받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 캐시의 말을 따라 작품을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정작 서술자 캐시는 이 비밀을 숨길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작품의 말미에 가서야 그 전말이 모두 드러나는 '비밀'은, <식스 센스>와 같은 일반적인 스릴러 서사물의 '반전'처럼 기능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를 보내지 마』는 명작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독자들은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헤일셤의 비밀이 서사를 이해해야 하는 자신에게만 비밀이었을 뿐, 캐시에게 그것은 애초에 비밀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작가가 숨겨놓은 줄 알았던 비밀은 어느새 독자가 직접 만들고 키워낸 비밀이 된다. 비밀이 밝혀짐에 따라 독자들의 궁금증은 시원하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찝찝한 형태로 증폭된다. 비밀을 알고 나면 캐시가 했던 말들이 더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뭉스러워진다. 캐시를 비롯한 헤일셤의 아이들은 그토록 가혹한 비밀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추억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니, 정작 현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과 다른 나는, 적어도 그들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 있을 나는 그들보다 더 '인간적'인가. 인간적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며, 그래서 인간은 결국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는 것일까.
『나를 보내지 마』가 던지는 질문은 끝이 없다. 그리고 나 역시, 아직까지 그 질문들 중 어느 하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야기나 주제의식에 대해 이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또한 '권하다'라는 지면의 제목에 어울리지 않는 과잉친절이 되리라. 그러니 독자들이 직접 읽고 명작이란 어떤 것인지 음미할 수 있기를 권하고 싶다. 물론 『나를 보내지 마』가 천하일미의 성찬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비밀 이야기에 빠져들어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에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명작의 맛을 충분히 감각해 볼 수 있으리라.
이영서 강의전담교수 (문예창작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