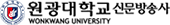지난 주말, 아버지에게 어울릴 만한 머플러를 하나 샀다. 어떤 기념일도 아니었지만 항상 고생하시는 아버지에게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다. 포장되어 있는 선물상자를 보며, 또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말 내내 설렜다.
월요일 아침. 선물을 붙이고 나서 뿌듯한 마음으로 교내 우체국을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곳에서 보지 말았어야 할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어떤 학생들이 오늘 자 <원대신문>을 쌓아놓고, 택배 박스에 마구 쑤셔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지만 곱씹을수록 원대신문 기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시 되돌아가 불쾌함을 표현했고, 그 행동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노력한 지난 한 주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다. 만감이 교차한 순간이었다.
생각해 보면 매주 신문을 발행하는 과정이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과 닮았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지 고민한다. 또 선물을 주기 전 까지 노심초사하며 받는 이의 반응을 걱정한다. 신문 발행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신문을 작업하는 내내 본지 기자들은 '독자들은 이번 주 신문을 어떻게 읽어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사랑하는 이에게 머플러를 선물하는 것처럼 매주 독자들에게 신문을 '선물'하는 것은 정말로 보람차고 설레는 일이다. 비록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그 어떤 선물이라도 의미 없는 선물은 없을 테니 말이다.
김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