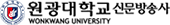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불편하다. 첫째로 2차 대전 패망 이후 미군에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작품 속 인식이 은근히 불편하다. 둘째로 작품이 전체적으로 던지는 질문 자체가 불편하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이는 가끔씩 사람들끼리 고민하게 되는 주제다. 양심은 어떨까? 사람의 양심과 동물의 '양심은 같을까?' 이 작품은 내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작품은 일본을 찾은 한 외국인 '조니 헤이워드'의 죽음으로 시작한다. 조니 살인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찰 무네스에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일반적으로 칼에 찔린 사람은 자신의 몸에 박힌 칼을 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조니는 칼이 꽂힌 채 택시를 타고 병원이 아닌 호텔까지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다. 작품은 사건의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추리소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작품의 전개는 다르다. 이 작품이 일반적인 추리 소설이라면 이야기는 단순히 피해자(조니)나 수사관(무네스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작품은 그런 틀을 자연스럽게 깨버린다. 작가는 독자들이 예상을 깨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보여준다. 무네스에가 수사협조를 요청한 이억 만 리 미국 뉴욕의 형사 켄의 이야기처럼, 조니 헤이워드 살인사건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부인 야스기와 아들 교헤이, 갑작스레 사라진 아내를 찾는 남편 오야마다의 이야기가 그렇다.
생뚱맞게도 상관없을 것 같은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살인, 폭행, 비행, 불륜, 철저한 방치 등의 비인간적 사건들로 이어져있다. 인물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거의 완벽하게 감추려 '노력'한다.
특히 혈연 관계에 있음에도 서로를 최악으로 평하는 인물들이 똑같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독자를 충격에 빠지게 한다. 야스기는 자신을 찾아온 숨겨진 아들을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죽인다. 이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고향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화목한 가족인 척 하는 엄마 야스기를 아예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여기는 교헤이는 뺑소니를 저지른다. 그리고 사실 은폐를 위해 시체유기를 저지른다. 심지어 시체를 산 속에 묻고 난 뒤, 그 무덤 위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미치코와 정사를 나누고 해외로 도망을 가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렇다고 뺑소니 시체유기사건의 피해자 후미에가 떳떳한 사람인 것도 아니다. 심지어 후미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 역시 성폭행과 관련 있을 정도로, 사건은 인간의 욕망과 연계된다.
작품 속 인물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때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은 때이다. 그나마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야스기가 최소한의 인간의 마음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살인범의 추궁에 자신의 범죄를 털어놓는 장면을 독자의 찝찝함을 살짝 덜어준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혈육을 죽인 데 대한 죗값을 치른다거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는 말이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짐승만도 못한 짓'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주 늦게라도 그것을 뉘우치는 것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행위일까?'라고 묻는 듯하다.
작품의 전개가 다소 작위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작품의 메시지를 읽는 데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만약 이 작품을 가볍게 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작품을 원작 삼아 만든 지성, 염정아 주연의 드라마 <로열패밀리>(2011, MBC)와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서로 다른 작품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각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